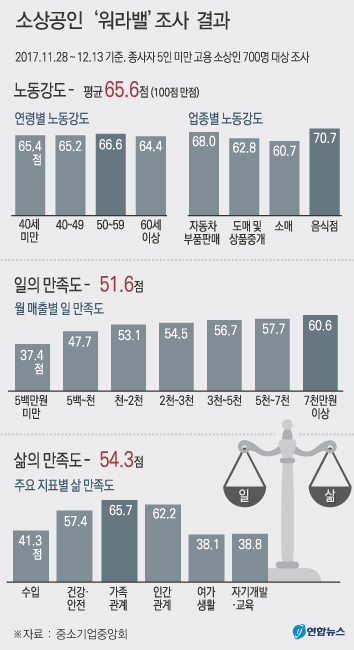
소상공인들에게 ‘워라밸’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배경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에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은 요식업 등 경쟁이 심한 업종에 쏠려 있는데다 자본이나 기술력 없이 저임금 노동에만 의존해 매출이 줄면 본인의 근로시간을 늘려 때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매출은 주는데, 인건비 등 고정비 올라
일단 지속된 내수침체에다 시장 과포화로 점포당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10인 미만의 음식, 소매, 도매,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020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벌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월 평균 215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 감소했다.
월 평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7.3% 감소했다. 매출액이 지속해서 줄어든 반면 인건비, 재료비 등의 고정비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메뉴 개발, 가격 인하, 프로모션, 원가절감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데다 운영비도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
소상공인들은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이다.
동대문역 근처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평일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본인이 직접 나와 커피를 만든다. B사장은 “알바생 2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월급을 대충 계산해보니 약 50만원이 넘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알바생을 1명으로 줄이고 가게 일을 보고 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만을 고용 축소 등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는 모두 569만7000명이다. 이 중 직원을 한명도 두지 않아 최저임금과는 사실상 무관한 ‘나홀로 사장’이 413만7000명으로 10명 중 7명꼴이다. 이들에겐 높은 상가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관련 비용이 장시간 노동에 묶어두는 고질적인 ‘족쇄’다.
종로구에서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가게 임대료가 더 걱정”이라며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매출이 고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매달 임대료 걱정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는 하루 매출이 1000만원까지 나왔지만 최근에는 100만원 채우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동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매출은 안나오고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높은 상가 임대료도 장시간 노동 ‘족쇄’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3000곳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4곳 중 3곳은 월세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가 70.5%고 보증금 없는 월세는 2.9%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매분기마다 내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서울 상가 임대료는 23% 상승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30평짜리 상가를 임대한 소상공인은 임대료로 월 62만3700원(270만2700원→332만64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초반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가 향후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는 신도시가 있고,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렌트프리’ 기간을 늘리는 지역도 있다”며 “이처럼 지역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차별성을 두지 않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각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