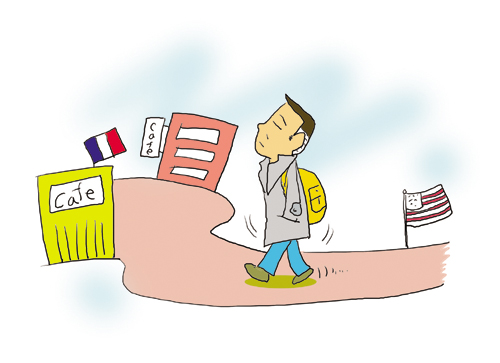
90일간의 ‘자발적 유배’
누구나 갑자기 방향감각을 잃을 때가 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직장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게임에 패배해서, 누군가의 음해를 받아서,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아서 흔들릴 때가 있다. 그때 삶의 좌표가 보이지 않고 좌절감이 찾아온다.
탁현민이라는 사람은 공연연출가다. 그는 공연연출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온 대학교수다. 그는 공연으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게 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나 그가 꾸민 무대는 실패로 끝났다.
그 남자는 좌절했고, 뉴욕, 파리, 모그바티스를 떠돌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다른 세상으로 유배 보낸 자발적 유배자였다. 그리고 변명처럼 <흔들리며 흔들거리며(미래를소유한사람들 刊)>란 기행문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떨고 싶었다.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다. 냉소와 무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흔들릴 때 차라리 춤을 추듯 전신을 흔들거리며 좌절을 잊어버리는 치유법이 있다. 탁현민은 상처가 푹푹 썩으면서 익어가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재충전의 시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발효의 시간’을 위해 그는 낯선 곳으로 떠났다, 그곳이 뉴욕, 파리, 모그바티스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여행지에서 그는 게으른 발효를 한다.
뒤척이다 일어나면 거짓말처럼 오전 11시. 카페 로얄로 들어가서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하고 커피 향을 마음껏 즐긴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냥 강물 흐르는 방향으로 걷는다. 강변을 걷지 않을 때는 골목을 걷는다. 다음날도 마찬가지다. 점심 때 쯤 일어나서 이틀 전에 사다놓은 마른 크루상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체리잼을 발라먹고 또 거리로 나와서 걷는다. 파리는 ‘보행자의 천국’이다.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플 때쯤이면 언제나 카페가 나타난다.
파리는 카페의 도시다. 아무 카페에서 아무거나 시켜먹고 느긋한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100년 이상 된 카페를 찾아보는 낭만은 더욱 좋다.
헤밍웨이가 쓴 ‘파리는 날마다 축제’에 나오는 그가 자주 들렸다는 룩셈부르크 공원 부근의 ‘카페 플로르’를 찾아가보는 것도 좋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는 피카소와 헤밍웨이와 피츠제럴드가 이 카페에서 같이 만난다.
<흔들리며 흔들거리며>에서 여행의 절정은 모그바티스 방문이다. 모그바티스는 파리북역에서 떼제베로 4시간 걸리는 남부 해안도시 뤼트낭에서 배를 타고 3시간 쯤 가면 나타나는 마름모꼴의 작은 섬이다. 유명한 역사적 유적도 없고 풍광이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은 그냥 그런 섬이다. 탁현민은 거기서 그냥 흔들리며 흔들거리며 있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다. 마흔 넘은 아들과 일흔이 다 되가는 아버지의 통화.
어디냐?/모그바티스요./거긴 왜 갔는데?/그냥요./그냥 거기까지 뭐하러 가냐? 비행기타고./ 생각 좀 정리하려고요./여기서도 안 되는 게 거기가면 정리 되냐?/...../언제 오는데?/모르겠어요.
<흔들리며 흔들거리며>는 저자가 자신을 유배 보냈던 석 달간의 여행기다. 이 여행에서 저자는 충분히 발효돼 돌아왔을까? 상처 입은 날개가 다 아물었을까?
이채윤·삽화 이동규


